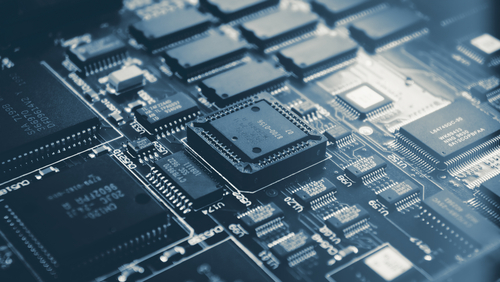1. 기억과 떠올리기
1-1. 기억과 떠올리기 연습
-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떠오르므로, 이를 위한 망각 곡선을 측정함
- (중요) 공부를 통해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떠올려 써먹기 위함임
- 지식을 떠올리려면, 떠올리기 연습을 해야 기억이 잘 남음
- 과학 연구에서, 테스트를 해서 망각 곡선을 측정하는 것은 기억에 영향을 줌
- 테스트를 하면 기억이 왜곡된다는 것이 알려짐
1-2. 떠올리기 연습의 효과
- 동일한 과학 지문을 주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을 비교한 실험 결과, 반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기억이 더 잘 남음
- (중요) 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떠올리기 연습을 한 것이 효과적임
- 주관식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에서 기억이 잘 나옴
- (중요) 글로 쓰거나 도식화할 때는, 떠올리기 연습을 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음
- 퀴즈에서, 틀린 문제를 고치면 다음에도 같은 문제를 잘 떠올릴 수 있음
1-3. 이해와 응용
- 박쥐의 생태에 관한 지문을 주고, 다시 공부하거나 퀴즈를 본 결과, 응용 문제를 만들었을 때, 떠올리기 연습을 한 사람이 응용 문제를 더 잘 풀었음
- 설명을 하거나 질문하면서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함
-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질문하거나 설명하며 내용을 떠올려보는 것이 좋음
화자 1
00:00
이 실험에서는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한 사람보다 그 시간에 이것을 한 사람들의 기억이 더 오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흔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지식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이나 생활 아니면 시험에서 그 지식을 떠올려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노래를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노래 부르는 걸 연습해야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운 걸 잘 떠올리려면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기억이 잘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을 떠올리는 연습과 관련된 과학 연구들과 이것을 실제 공부에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떠오르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망각 곡선입니다.
화자 1
00:53
망각 곡선을 측정하려면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서 몇 %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해서 이걸 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테스트를 자주 하면 곡선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더 완만한 망각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측정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테스트를 할 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망각 곡선을 정확히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헨리 레디거와 제프리 카픽이 현상 자체가 가진 중요성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과학 지문을 나눠주고 같은 시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을 주고 사람마다 무작위로 다른 지시를 주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문을 다시 공부하게 시켰고요.
화자 1
01:51
다른 사람들에게는 빈 종이를 주고 지문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쓰게 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여기서 또 사람마다 시험까지 시간 간격이 달랐습니다. 5분 뒤에 시험을 본 경우에는 지문을 한 번 더 공부한 사람들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일주일 후에는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계속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읽고 나서 떠올리기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논문은 4천 번 이상 인용되며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단히 많은 연구가 이뤄지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학교 수업을 듣는 경우 단어 외우기 심지어 사람 얼굴을 외울 때도 떠올리기 연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화자 1
02:48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뤄진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은 앞의 실험에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다 써도 되고 퀴즈처럼 해도 됩니다. 다만 효과는 생각나는 걸 다 쓰는 것이 더 좋고 퀴즈로 할 때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오답과 정답이 섞여 있고 그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데요. 일단 기억이 잘 안 나도 이건가 하고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떠올리는 연습이 잘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오답에 노출이 되어서 그걸 답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객관식의 경우 한 번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음번에도 같은 오답을 또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퀴즈를 풀 때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주관식보다는 서술형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 쓰지 않고 도식화를 해서 나타내면 어떨까요?
화자 1
03:46
이런 방법에는 마인드맵이나 컨셉트 맵 같은 것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은 중심 개념을 가운데 쓰고 거기서 가지를 쳐서 관련된 개념을 적는 도식화 방법입니다. 컨셉트 맵은 비슷한데 중심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념들을 적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해서 도식화하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지문을 읽고 난 뒤에 기억나는 대로 글을 써보라고 시키거나 또는 컨셉트 맵으로 그려보라고 시켰습니다. 결과를 보면 컨셉트 맵을 그리는 경우보다 글로 쓸 때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해서 썼는데요.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을 때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도식화를 할 때는 짜잘한 것은 굳이 그려 넣지 않기 때문에 떠올리기 연습을 할 때는 마치 적게 떠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습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자 1
04:39
어차피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떠올리는 양이 비슷하면 종이에 뭐라고 쓰는지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 쓰든지 도식화를 하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세하게 종이에 써보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맞게 떠올렸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좋죠. 맞게 떠올렸을 때는 굳이 정답을 안 봐도 되는데요. 틀리게 떠올렸을 때는 정답을 보고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퀴즈를 봤는데 거의 다 틀렸다 아니면 내용을 떠올려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러면 떠올리기 연습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답을 안 알려주면 효과가 적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 확인하면 좋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보면 퀴즈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안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퀴즈에 나온 내용은 기억에서 떠올려 볼 테니까. 다음에도 기억이 잘 나겠죠. 그러면 안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화자 1
05:38
그것은 내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퀴즈에 직접 나오지 않았어도 퀴즈와 관련된 내용은 퀴즈를 풀면서 어느 정도 같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퀴즈에 직접 나온 것만큼은 아니지만, 전혀 관련 없는 내용보다는 나중에 더 잘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은 퀴즈에 나온 내용이고요. 파란 선은 퀴즈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 회색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20분 후에 시험을 보면 셋 다 비슷한데요. 하루가 지나면 퀴즈에 나온 내용이 가장 잘 기억나고 관련된 내용은 그다음 관련 없는 내용이 가장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가 더 커지죠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은 기억도 더 오래가게 하지만 이해도 더 잘 가게 도와줍니다.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박쥐의 생태에 관한 지문을 읽게 했는데요. 이때 사람에 따라 지문을 한 번 더 공부하게 하거나 퀴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았는데요.
화자 1
06:36
이번에는 응용 문제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에는 박쥐가 음파로 물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시험에서는 박쥐가 곤충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죠. 여기 그래프에서 흰색은 한 번 더 공부한 사람들의 점수고 오른쪽 회색은 퀴즈를 본 사람들의 점수입니다. 회색 그래프가 두 개인 이유는 퀴즈가 두 종류라서 그런 건데요. 퀴즈 종류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고요. 어쨌든 이 실험에서도 떠올리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 응용 문제도 더 잘 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남에게 그걸 질문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혼자 이해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하려면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설명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은데요.
화자 1
07:34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보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자신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한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했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면 아홉 가지 활동을 주고 이 중에 뭘 해보고 싶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설명을 하거나 글을 써보거나 퀴즈를 풀어보는 기억을 떠올리는 활동이고요. 세계는 동영상을 다시 보거나 내용을 외우거나 노트를 하는 식으로 다시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나머지 3개는 그냥 딴 거 하는 거고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수록 기억을 떠올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걸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없고 부끄러우니까 꺼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더 많이 기억이 됩니다.
화자 1
08:33
그래서 뭔가 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떠올리기 연습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배운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종의 착시를 느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더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움이나 착시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될 때도 떠올리려고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논문에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다고 고르든지 간에 무작위로 일부에게 설명하기를 시켰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설명하기를 고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실제로 설명하기를 시킨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시험을 더 잘 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이 사람들은 딴 걸 고른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화자 1
09:30
이 경우에도 설명하기를 시켜보면 나중에 시험을 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설명을 해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퀴즈를 풀어보거나 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습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 눈물 흘리며 깨달은 독해력 높이는 법 (0) | 2025.02.21 |
|---|---|
| (뻔한 방법 X) 3천 명 넘는 학생들 성적 올린 전설의 암기법 (0) | 2025.02.20 |
| 경찰대 수석, 육사 수석, 서울대 4년 전액 장학생 변호사의 끝장 공부법 (0) | 2025.02.17 |
| 옥스포드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0) | 2025.02.17 |
| 가장 적게 공부하고 가장 빨리 합격하는 법 (0) | 2025.02.17 |